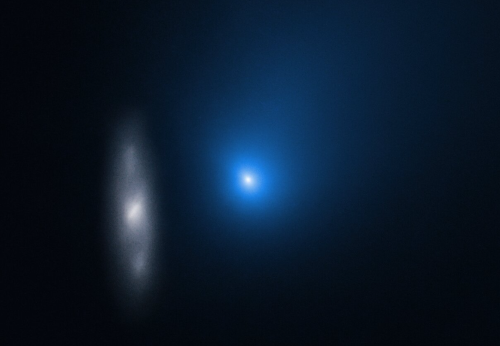모디 정부 지지자들뿐 아니라, 인도국민회의 내부와 외부의 신자유주의 성향 인사들까지도, 전체 계획경제(디리지즘) 시기에 대체로 기반이 되었던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THE Nehru-Mahalanobis strategy, 독립 직후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통계학자 프라샨타 찬드라 마할라노비스가 주도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모델. 195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 인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을 지금 극심하게 악마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점점 더 깊은 위기에 빠지고, 이에 대한 환멸이 널리 확산될수록,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디리지즘 체제와 대비하여 자신들이 이룬 전환을 더욱 목청 높여 찬양하고 있다. 디리지즘 체제를 깎아내리는 일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며, 이는 현재 정부의 성향에도 잘 부합한다는 ‘부가적 이점’까지 갖는다.
 출처: Unsplash, rupixen
출처: Unsplash, rupixen
사실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좌파는 네루주의 전략에 대해 전혀 다른 이유에서 비판해 왔다. 좌파의 비판과 신자유주의적 비판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좌파는 식민지 시기의 국제 분업 구조를 단절하려 했던 네루주의 전략, 생산재(마르크스의 제1부문)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려 했던 시도, 기술적 자립을 구축하려 했던 노력, 공공 부문을 경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책, 모든 광물 자원을 국유화한 조치, 주요 은행과 보험회사를 국유화한 조치, 식민지 시절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던 외국 자본을 배제한 조치 등을 모두 지지해왔다. 이 모든 조치는 신자유주의 세계관이 반대해 온 것이며, 좌파는 일관되게 이를 지지해왔다.
좌파가 네루주의 전략을 비판한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 이 전략은 내수 기반 성장 전략이었다. 그런데 인도처럼 내수가 성장하려면 농업 부문이 성장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개혁이 필수적이었다. 좌파는 네루주의 전략이 토지 소유의 집중을 해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질 경작자들에게 경작권 보장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내수 기반 발전을 시도한 것이라 비판했다. 좌파는 디리지즘 체제 하의 성장이 이런 조건에서 너무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거나,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빈곤을 극복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 도입을 저지할 만한 계급적 저항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실질 경작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서벵골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는 '바르가 작전(Operation Barga, 1978년 인도 서벵골(West Bengal) 주에서 좌파 정부가 시행한 소작농 권리 보장 및 토지개혁 프로그램)' 이후 1990년대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업 성장률을 기록했다. 네루주의 디리지즘은 이 점에서 실패했다.
반면 신자유주의자들의 네루주의 전략 비판은 전혀 다른 내용이며, 일종의 지적 눈속임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향적 발전 전략’과 ‘외향적 발전 전략’을 대비시키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근거로 후자가 훨씬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도도 네루주의적 ‘내향적’ 전략 대신,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한 ‘외향적’ 전략을 따랐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외향적’ 전략은 재화·서비스·자본(금융 포함)의 유입을 허용하는 경제 개방, 극소한 재정 적자를 유지하는 ‘재정 책임성’ 부과, 임금 억제와 노동자의 파업 빈도 감소를 통해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동아시아 경험에 대한 해석에서도 기만적이었다. 후속 연구들은 동아시아가 재화·서비스·자본(특히 금융)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모델의 사례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론적으로도 ‘외향적’ 발전 전략은 각국이 원하는 만큼 수출할 수 있는 ‘소국 가정(small country assumption)’에 기반해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어느 시기의 세계 수요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더 많이 수출하면 다른 나라의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설령 모든 국가가 동아시아 전략을 따라도 동등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되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호 경쟁 구도로 밀어 넣었다. 각국은 다른 나라보다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하향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가 농민과 영세 생산자에 대해 제공하던 지원은 점차 철회되었고, 그 결과 이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수요 총량이 급감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디리지즘 시기보다 GDP 성장률이 빨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 ‘가속화’ 자체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전직 인도 정부 수석 경제자문관조차 현재의 공식 GDP 성장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남의 GDP로는 음식을 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디리지즘 시기와 신자유주의 시기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자 대중의 실제 생활 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자 대중이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 대해 가장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등이 운영하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독립 당시 인구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던 비율은 약 12%였으며, 이는 1982년에는 6%로 낮아졌으나, 신자유주의 시기 이후 급증하여 2023년에는 23%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0년간 추정치가 존재하는 기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심지어 식민지 시기보다도 더 심각한 불평등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자 대중의 삶이 절대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들이다. 이 시기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농민 자살의 물결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표, 즉 농촌 인도의 평균 1일 칼로리 섭취량을 살펴보자. 과거 인도 기획위원회는 농촌 인도에서 1인당 1일 2,200칼로리 섭취를 빈곤선 기준으로 삼았다. 1973–74년, 전국표본조사(NSS) 소비지출 데이터를 통해 빈곤이 처음 측정되었을 때, 이 기준 미달 인구 비율은 56.4%였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1993–94년에는 58.5%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1–12년에는 이 수치가 67%로 대폭 상승했고, 2017–18년에는 8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시점에서 모디 정부는 NSS 데이터 수집 방식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과거 수치들과의 비교가 불가능해졌다.
즉, 네루주의 전략 아래에서는 농촌 빈곤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독립 직후의 참담한 상황에 비해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일정한 수준의 빈곤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관련 수치가 없다. 1973–74년부터 1993–94년까지 농촌 빈곤 비율이 대체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좌파 비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농촌 빈곤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네루주의 전략은 토지개혁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 퇴치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 대중의 처지에 있어서 만큼은 신자유주의 전략보다 분명히 우위에 있었다.
신자유주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식민지 시기의 경제정책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역시 (전간기의 제한적 ‘차별적 보호’ 정책을 제외하면) 재화·서비스의 자유로운 유입과 자본·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이 특징이었다. 이 전략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공공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확장이 불가능한 인도 국토를 세계 대도시들의 수요에 맞춰 개방하도록 요구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공공투자를 억제한다. 이로 인해 현지 주민들은 필연적으로 영양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전략이며, 브레턴우즈 체제의 국제기구들과 선진국 정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빈곤이 사라지고 있다며, 식량 곡물의 공공 조달과 배급 같은 정부 개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도 국토를 대도시 수요에 완전히 개방하는 데 남아 있는 제한조차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현재 네루주의 전략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흐름에 앞서 등장한 전주곡이다.
[출처] Vilifying the Nehru-Mahalanobis Strategy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그는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 몸담았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