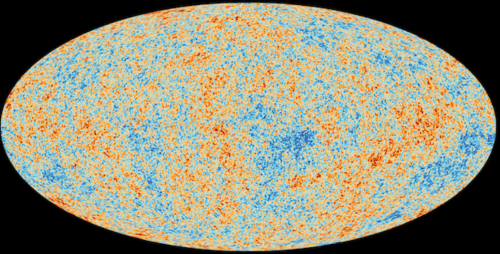보통 기억력과 역사적 지식이 금붕어 수준에 불과한 미국인들은, 러시아 혐오 정서가 손쉽게 조장되는 이유를 매카시 시대의 적색 공포나 이후 러시아인을 악역으로 그린 영화와 소설 탓으로 돌릴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안타깝게도 반(反)소련 편집증을 풍자한 영화 <러시아인이 온다>(The Russians Are Coming)는 예외였고, 그 예외가 오히려 규칙을 증명했다.
하지만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의심과 반감은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기원은 가톨릭 교회가 동슬라브인에게 선교 활동을 벌이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티칸은 러시아인과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서구’에 뿌리를 둔 종교적·문화적 정체성을 심는 데 성공했다. 바로 이처럼 깊은 뿌리가 있기에, 단순한 ‘도그 휘슬(dog whistle, 은밀한 암시)’만으로도 러시아 혐오가 쉽게 작동하는 것이다.
소티로비치 박사는 미국이 국채를 팔기 위해 외국 자금에 의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견해를 반복하지만, 이는 연방정부 부채에 관한 한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틀렸음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만약 '투자자 반란' 같은 시나리오가 벌어진다면, 미국은 통화가치의 심각한 하락을 겪을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바로 그것이 트럼프 진영이 원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달러 가치를 현재보다 15~30%가량 낮추길 원한다고 한다.
아래는 블라디슬라브 B. 소티로비치(Vladislav B. Sotirovic) 박사의 글이다.
 출처 : Unsplash, Marek Studzinski
출처 : Unsplash, Marek Studzinski
2018년 스크리팔 공격 사건
서방이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는 현재의 전면적인 러시아 혐오 정책은, 집단적 서방(Collective West)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테리사 메이 내각이었다. 테리사 메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충성하는 ‘하인 같은 개(servant-dog)’ 역할을 했으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전쟁 내각(War Cabinet)을 구성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2.0의 새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 냉전은 원래 미국이 시작한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정치적·금융적 예속화 또는 점령이라는 주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당시 러시아에 대한 ‘처벌’은 외교적인 수위에 머물렀으며, 그 명분은 다음과 같았다. “러시아가 전직 이중 스파이(러시아/MI6) 세르게이 스크리팔(66세)과 그의 딸 율리아(33세, 모스크바에서 방문 중)를 신경가스로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였다. (2018년 3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러시아를 비난한 것은 “중세 시대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비난하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은 자명했다. 다시 말해, 2018년 스크리팔 사건은 아주 정밀한 지정학적 목적을 가진 또 하나의 서방식 ‘자작극(false flag)’이었으며, 이는 엘친 이후 다시 살아난 러시아를 겨냥해 냉전 1.0을 이어가기 위한 도구였다.
냉전 1.0은 애초에 미국이 시작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루먼 행정부(1945~1953)는 소련의 팽창주의라는 신화를 이용해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을 가렸으며, 그 정책의 핵심은 미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서방이 퍼뜨리는 러시아 혐오 바이러스, 즉 냉전 2.0은 역사적으로 서방이 지속해온 반(反)러시아 정책의 자연스러운 연속이다. 이는 1989~1991년 소련의 평화로운 해체로 마무리된 듯 보였던 갈등이 다시 이어진 것이다.
헌팅턴의 경고와 국제관계
사무엘 P.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문명의 기반은 종교(즉, 형이상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 위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이 관점은 상당히 명확하고 타당하다. 그는 세계 정치의 미래가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직접적인 충돌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러한 양상이 국제관계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적·현대적 맥락 모두에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 본질은 다음과 같다. 서방 문명은 로마 가톨릭과 모든 개신교 교파로 구성된 ‘서구형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방 정교회 신앙을 가진 국가 및 민족들에 대해 전통적인 적대감을 품어왔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가장 크고 강력한 동방 정교회 국가이며, 따라서 유라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발생해 왔다. 그 시작은 독일의 튜튼 기사단과 발트해 연안의 스웨덴군이 러시아 북부를 반복적으로 침공하던 시기였다. 이 침공은 1240년 스웨덴군이 노브고로드 공 알렉산드르 넵스키에게 네바 전투에서 패배하며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불과 30년 후인 14세기 중반,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통치자 알기르다스(재위: 1345~1377)는 러시아 영토 점령을 시작했다. 이후 로마 가톨릭 공동국가였던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모스크바 대공국을 상대로 종교적·문명적 제국주의 전쟁을 벌였다. 이는 1385년 크레보 연합(Union of Krewo)을 통해 두 국가가 개인적 동군연합을 이루면서 본격화되었다.
바티칸의 역할
현재의 우크라이나(당시에는 이런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았다)와 벨로루시(백러시아)는 동슬라브인을 개종시키려는 바티칸 정책의 최초 희생양이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지역은 1569년까지 리투아니아에 점령·합병되었고, 1569년 폴란드-리투아니아 루블린 연합 이후에는 폴란드가 이를 지배하게 되었다. 1522년부터 1569년 사이, 리투아니아 대공국 전체 인구 중 63%가 동슬라브인이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정교회 신자들에 대한 바티칸의 강압적 재개종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반격을 통해 점령지를 해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까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반격에 나섰을 때에는, 이미 상당수의 동방정교 신자들이 로마 가톨릭 또는 유니에이트(그리스 가톨릭)로 개종해 본래의 민족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로마 가톨릭으로의 개종과 바티칸과의 통합은 18세기 말까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가가 점령한 지역에서 러시아 민족 공동체를 둘로 나누는 결과를 낳았다. 즉, 정교회를 유지한 이들과 친서방 개종자들로 나뉘었고, 후자는 사실상 본래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두드러졌는데, 이곳은 1596년 브레스트 합의에 따라 바티칸과 통합된 이후 세계에서 유니에이트(로마 가톨릭교회와 일치를 이룬 동방 기독교 교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서)우크라이나의 유니에이트 교회는 나치 정권과 노골적으로 협력했으며, 이로 인해 전후 1989년까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유니에이트 교회가 “우크라이나인”은 (소)러시아인이 아니라 러시아와 민족·언어·종교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의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렸다. 이로써 소비에트의 반러시아 정책 아래 소러시아인, 루테니아인, 카르파티아 러시아인의 성공적인 우크라이나화가 가능해졌다.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은 동유럽에서 서방의 반러시아 지정학적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수회는 서유럽의 반러시아·반동방정교회 세력의 핵심으로, 기독교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는 진정한 서유럽의 일부가 아니라는 주장을 퍼뜨렸다.
이러한 바티칸의 선전 활동으로 인해 서구는 점차 러시아에 적대적이 되었고, 러시아 문화는 혐오스럽고 열등한, 즉 야만적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는 비잔틴 동방정교 문명의 연장선으로서의 인식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이러한 러시아와 동방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국 주도의 집단적 서방에게 그대로 수용되었으며, 러시아 혐오는 이들의 지정학 프로젝트와 야망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지지자들은 세르비아인,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벨로루시인 등과 함께 팍스 아메리카나의 지정학적 적이 되었다.
서방의 패배와 러시아의 반격
서방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투쟁은 1700년 스웨덴이 개신교 세력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종교-제국주의적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대북방 전쟁, 1700~1721). 스웨덴은 1709년 폴타바 전투에서 패배했고, 이로써 표트르 대제의 러시아는 마침내 유럽 열강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 1812년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분열주의자”(정교회 국가) 러시아의 “유로문명화”라는 명분으로 이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이는 또 한 번의 서유럽적 대실패로 끝났다. 이는 양차 세계대전에서 범게르만 전쟁광들의 실패와 유사한 양상이었다.
그러나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의 서구화라는 “문명적” 역할은 나토와 유럽연합이 담당해왔다. 소련 해체 직후, 집단적 서방은 자국의 위성세력인 보리스 옐친을 러시아 대통령 자리에 앉힘으로써, 특히 구소련과 발칸 지역에서 막대한 지정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01년 이후부터 집단적 서방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반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옐친 시대의 친서방 정치 세력(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이 점차 러시아의 정부 구조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상실하면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러시아 정치 엘리트가 정확히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서구화 정책은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집단적 서방의 식민지화 전략을 감추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위장이며,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의 가치와 규범을 전 세계에 영구히 외재화시키려는 목적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외재화 정책”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시장 민주주의와 중앙계획 경제 간의 경쟁이 종식되었다.
따라서 냉전 1.0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1989/1990년 이후, 서방의 핵심 글로벌 지정학 프로젝트는 ‘서방 대 나머지(The West and the Rest)’였으며, 이에 따라 나머지 세계는 헤게모니 안정 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따른 단극적 세계안보체계에 따라 서방의 핵심 가치와 규범을 수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조적 일방주의는 21세기 미 주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패권 프로젝트로서, 사실상 단극 패권 체제로서의 팍스 아메리카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결정적인 반대자들로 떠올랐다.
안정 이론과 국제 관계
헤게모니 안정 이론에 따르면, 세계 평화는 오직 하나의 패권적 권력 중심(국가)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이 권력은 다른 모든 팽창주의적·제국주의적 야망과 의도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한다. 이 이론은 (초)강대국의 권력 집중이 전통적인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며, 이는 단일 초강대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 간 국제 관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나 대영제국 시대의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사상을 뒷받침하는 전례로 인용되며, 미 주도의 단극체제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정당화해왔다. 이런 시각은 냉전 1.0 이후의 세계가 팍스 아메리카나 하에서 미국의 글로벌 지배가 유지되는 한 안정적이고 번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자극했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패권은 세계적 차원의 경제 질서와 자유무역의 전제 조건이며, 압도적인 힘을 지닌 국가가 경제적·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는 신의 뜻이자 이성에 부합하는 당연한 질서라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패권 국가는 강제적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 이 외교는 대상국에 일정 기한 내에 요구 사항을 수용하라는 최후통첩과, 이를 거부할 경우의 처벌 위협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1999년 1월 프랑스 랑부예(Rambouillet)에서 미국 외교 당국과 유고슬라비아 정부 간 코소보 지위 관련 "협상"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나 헤게모니 안정 이론이나 양극 안정 이론과는 달리, 옐친 이후 러시아 정치 세력은 다극 국제 관계 체제가 다른 제안된 체제들에 비해 전쟁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 다극 안정 이론(Multipolar Stability Theory)은, 단극 체제처럼 권력을 집중시키지도 않고, 양극 체제처럼 세계를 두 개의 적대적인 초강대국 블록으로 나누지도 않기 때문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구조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예: 냉전 1.0 시기)
다극 이론은 국제 관계에서 여러 개의 자율적이고 주권적인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정치적 동맹이 생겨나는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본다. 이 이론은 본질적으로 국제 관계의 평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기반한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다수의 권력 중심이 존재하므로, 침략적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 정책과 냉전 2.0
2000년 이후 모스크바가 채택한 새로운 국제 관계 정책은 ‘패권이 없는 세계’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 정책은 냉전 1.0 이후 미국의 세계 패권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점에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쇠퇴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약속을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왔고, 막대한 무역 적자가 뒤따랐기 때문이었다. 현재까지도 미국 경제의 암으로 남아 있는 이 문제를 현 미국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치유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총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제 정치에서 미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심각한 징후는, 미국이 보유한 세계 금융 준비금의 비율이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며, 인류 역사상 존재한 가장 큰 채무국이다(36조 2,100억 달러, 국내총생산의 124%). 이는 군사비 지출이 막대한 데다 연방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그 외 다른 요인도 있다. 세계와의 무역 수지 적자(예: 2004년에는 6,500억 달러)를 미국 정부는 주로 해외 민간 투자자나 외국 중앙은행(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서 메우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 공공부채의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극도로 취약해진다. 결과적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동시에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에서 중국과 일본이 재정적으로 직간접적인 협조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심할 여지 없이, 1989/1990년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여전히 프랑스식 국가이성(raison d’état) 개념을 비현실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 개념은 국가 권력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을 현실주의적으로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인데, 미국은 그 중에서도 자국의 글로벌 패권을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의 보증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외 모든 이익과 목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실력 정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독일어 용어로, 권력 정치에 의해 질서가 결정되는 외교 정책을 의미한다. 즉, “강자는 원하는 대로 하고, 약자는 강요받은 대로 따른다”는 논리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맺는말
결국 현대 세계 정치와 국제 관계에서 이러한 현실을 현재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팍스 아메리카나 구상의 또 다른 트로이 목마에 불과하며, 이와 함께 “강에서 강까지”를 외치는 자만적 시온주의자들의 ‘대이스라엘(Greater Israel)’ 개념을 뒤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미래에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 보다 민주적이고 다자주의적인 국제 관계 체제를 수립할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2014년 이후 미국 주도의 서방이 주도해온 ‘터보급 러시아 혐오(turbo Russophobia)’는 이미 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국면인 냉전 2.0 시대로 몰아넣은 상태다.
[출처] Centuries-Long History of Russophobia Opens the Doors to Cold War 2.0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
블라디슬라브 B. 소티로비치(Vladislav B. Sotirovic)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지정학연구센터(Centre for Geostrategic Studies) 연구원이다. 이브 스미스(Yves Smith)는 미국의 금융·경제·정치 분석가이자 블로거, 저술가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월스트리트의 권력 구조,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다.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